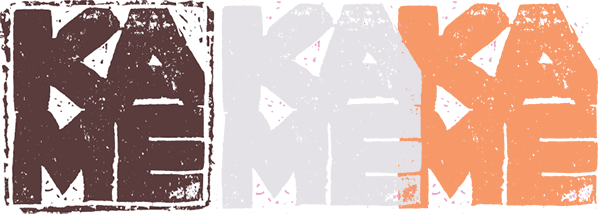평론-서예를 원천으로 하는 어떤 미술, 정해경의 종이 작업-이인숙(한국학 박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8-08 10:53본문
서예를 원천으로 하는 어떤 미술, 정해경의 종이 작업
이인숙 (한국학 박사)
* * *
"늘 집에서 일했어요. 일과 삶이 통합되는 게 좋거든요."
18년째 살고 있는 집이자 작업실에서 최근 한국의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키키 스미스(Kiki Smith, 1954년생)의 말이다. 그녀의 특이한 이름과 과격한 작업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식된 것은 한국미술의 동시대성을 우려한(?) 백남준(1932~2006)이 적극 나서서 1993년 7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유치한 휘트니비엔날레에서였다. 3월 뉴욕에서 열렸을 때 미국에서도 동성애, 인종차별, 여성주의운동, 다문화주의 등을 다룬 파격적 작품들로 논란이 있었다. 한국인들은 백남준의 뜻대로 충격을 받았고 필자도 어리둥절한 가운데 이전시를 보았던 기억이 있다. 비엔날레는 원대 동시대미술 중에서도 가장 첨단적 경향을 보여주는 미술행사다. 광주비엔날레가 생긴 게 1995년이니 그럴만도 했다. 이미 평가가 끝난 미술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현재 진행형인 미국미술을 한국 내에서 대규모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던 특별한 기회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몸을 소재로 삼아 여성 해방을 말했던 페미니스트 작가 키키 스미스는 스스로를 '가정주부 작가'(housewife artist)'라고 부른다. 정해경(鄭解慶, 1962년생) 또한 작업실이 집인 가정주부 작가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많은 가정주부 작가들이 나올 것이다.
* * *
예술이 직업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명과 암이 있다. 재능 있는 많은 작가들이 평생 예술을 하기 위해 예술가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기도 했다. '먹고사니즘'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즘'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작가정신의 생명인 자존심을 꺾거나, 돈 때문에 작품이 가야되는 길을 왜곡하게 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밝은 면이다. 예술이 직업이 아닌 작가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초구하는 작업을 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숙성이 더딘 예술인 서예는 특히 그러하다. 서예는 흰 종이, 검은 먹, 한 자루의 붓이라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지만 웬만한 수련(discipline)과 적공(積功)의 강밀도 없이는 붓과 먹, 필묵(筆墨)을 장악할 수 없다, 수백, 수천, 수만 번을 찍고 긋는 수련이 있어야 그 단순한 점획을 자신의 것으로 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밥이 걸려 있지 않음에도 그 치열성을 어떻게,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하는 관건이 남아있다. 취미와 예술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 * *
정해경은 1980년대 정암(汀巖) 이원식(李源植, 1923~1994)의 문하에서 착실하게 전통서예를 공부하고, 계명대학교 서예과와 대학원을 마친 서예가이다. 서예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궁극의 예술이었다. 서예는 문자를 쓰는 실용의 필기수단이면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똑같이 쓰는 법이 없는 점 . 획 . 선을 감상하는 추상적인 미술이었고, 지식인이면 누구나 하는 문자를 쓰는 일은 사실은 자신의 전인격을 그대로 내보이는 일이었다. 서예는 심성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예술이었다. 그러므로 서예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서예의 역사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장막을 헤치고 새로운 문자예술을 펼쳐 보인 작가들로 이어져 왔다. 정해경은 서예에 대한 애정과 수련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서예를 원천으로 하는 미술로 옮겨가고 있다. 서예는 어떻게 하면 현대미술이 될 수 있을까? 오랜 역사시기를 거치며 쌓여 온 서예의 가치, 서예의 정신, 서예의 예술적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대 미술로서 기획전에 초대되고, 아트페어에 나가며, 옥션에서 경매되는 지금의 미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 *
정해경은 이번 작업을 위해 먼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달 간 화선지에 먹으로 붓글씨를 써서 서예작품을 만들었다. 임서(臨書)한 것은 청나라 등석여(鄧石如, 1743~1805)의 <백씨초당기(白氏草堂記)>지만 그 자취를 찾을 길은 없다. .j작품들을 석 달 동안 손으로 낱낱이 찢어 평면에 붙였기 때문이다. 애써 쓴 작품들은 모두 사라졌다. 공부 했고, 그리고 버렸다. 정해경이 배우고자 했던 등석여, 예서의 필법으로 쓴 전서의 기세가 왕성하면서도 듬직한 그 맛은 그녀의 마음 속 에만 남았고, 수련의 결과물인 서예 작품은 파편이 되어 물결처럼 일렁이며 표면을 나풀거리는 희고 검은 화선지 조각들이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켜켜의 집적 속에 동성로를 활보하는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담고자 했다.

* * *
서예를 원천으로 한다고 할 때 무엇을 꼭 가지고 가야할까?
붓질... 먹색... 종이... 라는 매체성을 고수해야 하나?
문자의 점획... 수묵의 모노크롬... 종이의 물성... 이라는 양식을 남겨야 하나?
一氣呵成의 일회성... 書如其人의 인격성.. 이라는 수행적 가치를 지켜야 하나?
미술의 역사에 한계란 없으며,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작가가 그걸 열어 보여줄 때 찬탄할 준비가 되어있을 따름이다.
[2014 창작과 비평, 대구미술비평연구회 평론집 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