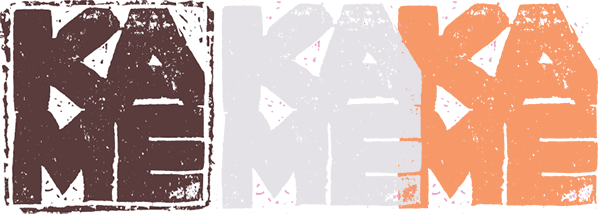평론-정해경의 하늘이미지 - 노상동(대구미술비평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8-08 13:57본문
정해경의 하늘이미지
노상동(대구미술비평회)
"내가 꽉 잡고 절대 놓고 있지 않는 것이 뭘까?
이번 작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였다.
움켜지고 있던 양손을 놓았다.
손이 자유로워지고 귀 눈 코 머리. . .
넘치도록 펼치고 지우고, 숨을 고르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 . "
위의 글은 한지꼴라쥬 작품으로 전시한 2011년 '정해경 현대문인화전'에 쓴 작가노트이다. 비우고 반복하는 정해경의 심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이 전시는 나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었다. 작품제목도 없고 구체적인 형상도 없었다. 하늘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땅에 쌓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절벽에서 물이 떨어져 못에서 물결이 춤을 추는 듯 했다.
계명대학교 서예과 학사 .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전통서예와 문인화를 두루 익힌 정해경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문자를 해체하여 깊이감을 나타내는 화면을 구성하여 자기만의 형식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번에 대구미술비평연구획가 초대한 '2014 창작과 비평-평론가 선정 6인전'에 전시될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이전에 보았던 평면적 이미지보다 입체적 이미지가 두드러져 보였다. 역시 구체적인 형상은 없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로 무엇인가가 지나가고 있는 듯 했다. 수평성보다 수직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정해경이 직접 쓴 서예 작품을 찢어서 겹겹이 붙여 놓았다. 글자인지 단순한 획인지 알 수 없는 흔적만이 있었다.
우리는 대체로 바탕 위에 있는 주제만을 생각하고 바탕의 존재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해경은 주제를 해체하고 숨기면서 바탕의 존재를 탐구하고 있었다. 이것은 듣고 보고 느끼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존재의 문제였다. 아주 어린 시절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기 전에 '하늘천 따따지 가마솥에 누렁이 빡빡 긁어서...'라고 하는 골목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닌 노래가 생각이 났다. 혹시 정해경은 하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평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방대한 사서삼경의 내용을 압축하면 천자문의 내용이 되고 천자문의 내용을 압축하면 천자문의 첫 글자인 하늘 천(天)이 되고, 우주변화의 모든 원리를 압축하면 주역 64쾌의 내용이 되고, 주역 64쾌의 내용을 압축하면 주역 64쾌의 첫 쾌인 중천 건(乾)이 된다고, 모든 현상은 하늘에 연결된다.
정해경은 자기가 한 작품을 찢고 붙여서 새로운 화면을 만든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부수고 부수어 하늘을 만든다. 부서진 해와 달이 해체된 하늘을 만든다. 자신을 비우고 비워서 존재를 묻는다. 전통서화의 경우 수천 년 동안 주제와 싸우면서도 여백의 존재는 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정해경은 이 신성한 역백의 존재에 도전을 하고 있다.
동양미술의 경우 왕유(王維, 699?~759), 소동파(蘇東坡, 1037~1101)를 거쳐 서위(徐渭,시키는 1521~1593)에 이르면서 대상의 묘사보다는 사유에 의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현하여 자연의 변화원리와 일치시키는 문 인화가 발전하였다. 주제는 점점 단순화되고, 바탕의 여백은 확대된다. 전통개념의 시서화 일치, 유불선의 융합에 의한 문인화의 전통이다. 팔대산인(八大山人, 1624~1703)에 이르면 여백의 존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 서세동점에 의한 현대화의 와중에서 전통의식은 서서히 무너지고 해체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예의 경우 글씨가 곧 사람이라는 전통의식이 사라지면서 사람은 사라지고 글씨만 남아 있는 존재 상실의 현상이다. 천지간에 하늘은 사라지고 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해경은 용감하게 하늘을 찾아 나섰다.
동양사상에서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변화 상생하는 것이 도(道)라 할 때 양속에 음이 있고 음속에 양이 있으며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다. 하나인 하늘이 현상의 하늘과 땅으로 나타나 변화한다. 이 변화는 주기에 따라 변화한다. 시간은 하루, 한달, 일년의 주기로 변화하고, 봄.여름.가을.겨울에 따라 만물의 현상은 변화한다. 봄에 씨앗에서 난 싹은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고, 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되면 열매는 씨앗이 되어 싹을 낸다. 이렇게 순환 변화하는 현상에서 볼 때 현상의 구상은 존재의 추상이 되고 추상은 다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정해경의 화면은 관습화되고 기능화 된 주제를 해체하면서 그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즉 찢어진 종이조각으로 화면위에 올라간다. 개념화된 전통의식의 이성이 아니라 지각화 된 초 이성으로 만지고느낄 수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새로운 여백의 하늘을 찾고 있다.
현대는 그야말로 디지털의 시대이다. 동서양이 융합되고 공간이 좁아지고 시간이 단축되는 시대에 전통서화가 어떻게 살아남아 현대와 호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정해경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화가들의 난제이다. 정해경은 전통의식을 잃지 않고 추상화시키면서 유학에서 말하는 도(道), 도교에서 말하는 무(無),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 서양에서 말하는 존재(存在)의 문제를 탐구하는 화면을 찾아가고 있다.
달이 녹아 하늘이 된 그 하늘에 다시 달이 떠오르기를 기대해본다.
[2014 창작과 비평, 대구미술비평회 평론집 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